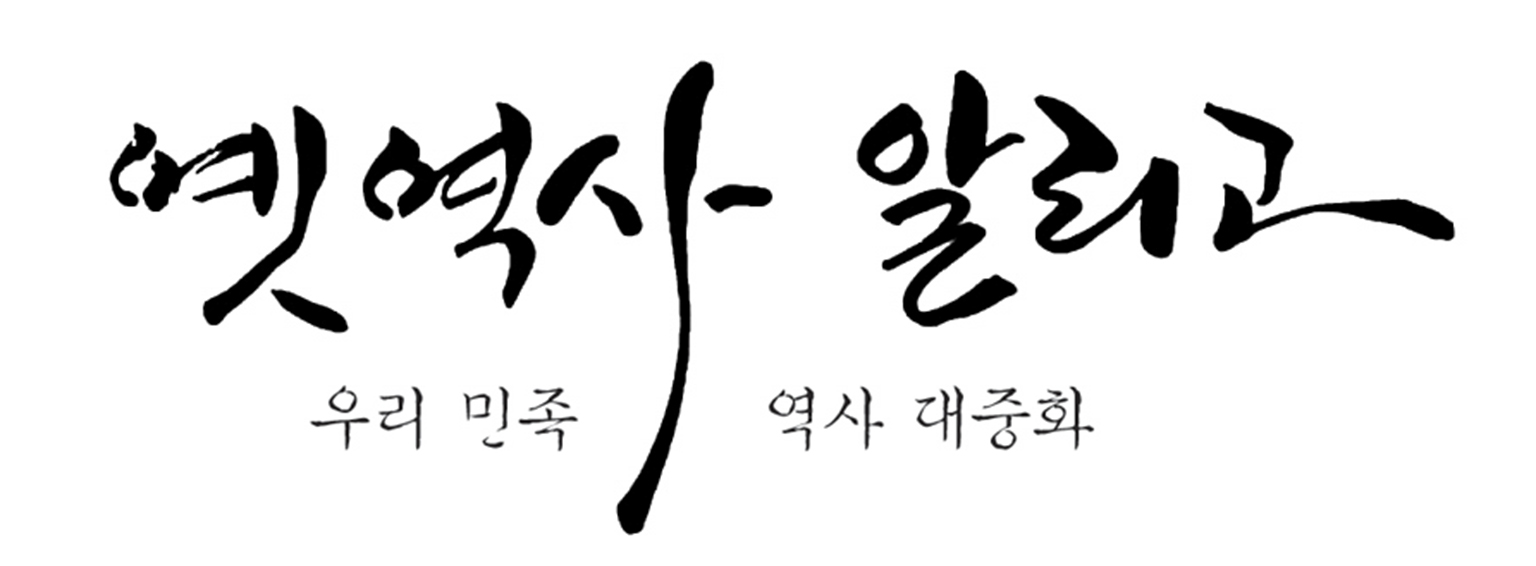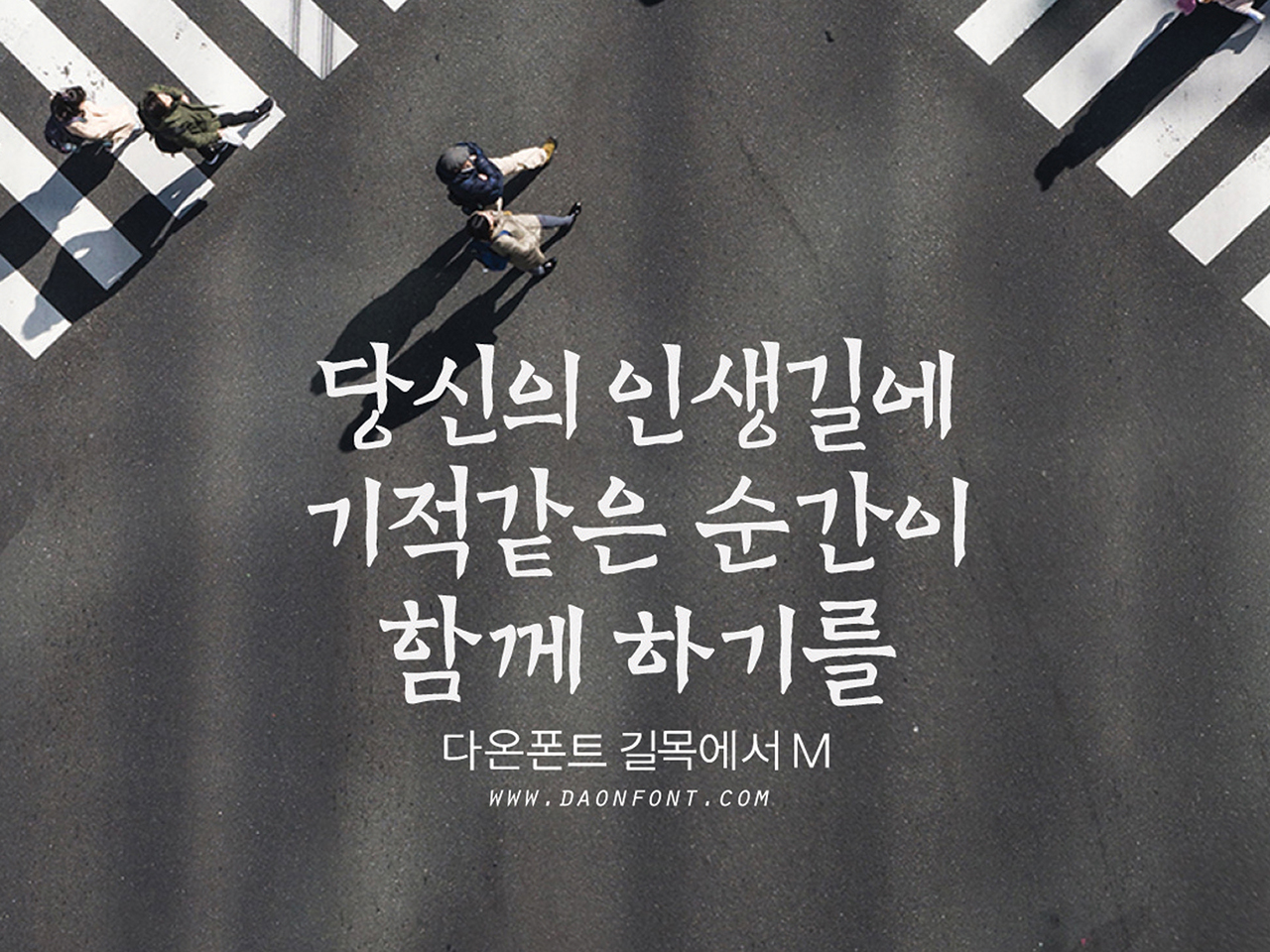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근원이 궁금할 때는 옛말이나 어원을 찾아 그 뜻을 알아본다. 그러면 그 옛말이나 어원을 이루는 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러나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문헌이나 참고할 자료가 없다.
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굳이 추측해 보면 옛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 쓰던 말들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고 그 말들이 점점 많아져서 말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그냥, 어쩌다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우리말의 홀소리에서 ‘아’는 ‘어’보다 작은 뜻을 나타내고 ‘오’는 ‘우’보다 작은 뜻을 나타낸다. 특히 의성어 의태어에서 잘 나타나있다. 만약 말이 그냥 어쩌다 무턱대고 만들어졌다면 ‘아’가 ‘어’보다 큰 뜻을 나타내는 말도 있고 ‘오’가 ‘우’보다 큰 뜻을 나타내는 말도 있어 뒤죽박죽됐을 텐데 우리말에서는 예외가 없다. 우리말에서 ‘아’는 사물이나 생물의 작은 상태를 나타내는데 쓰였다. 강아지, 송아지, 병아리, 항아리, 씨앗, 알, 아기, 아이 따위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아’는 작은 상태의 사물 또는 어떤 생물이 성장하기 이전 처음 상태의 사물이라는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어’는 큰 상태의 사물 또는 성장한 상태의 사물이라는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물이나 생물이 커지거나 성장하려면 다른 사물이나 물질을 흡수하거나 합하여 져야한다. ‘어’는 사물이나 생물이 다른 사물이나 물질을 흡수하거나 합해지는 상태 또는 합해진 상태의 뜻을 생각해볼 수 있다.
몇 몇 낱말의 뜻으로 낱소리의 뜻을 판단할 수는 없다. 낱소리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그 낱소리가 쓰이는 모든 우리말의 낱말에서 그 뜻을 찾아봐야 한다. ‘아’의 뜻을 찾으려면 ‘아’가 쓰여 지는 순우리말을 모두 모아 ‘아’가 나티내는 공통의 뜻이 있는지 찾아보고 공통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낱소리 ‘아’의 뜻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말의 홀소리와 닿소리의 뜻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말 낱소리의 뜻을 찾으려면 말이 시작됐을 그 때의 옛말에서 그 뜻을 찾아야 한다. 말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끊임없이 변한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집대성할 때의 말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말처럼 알아보기 어려운데 수천 년일지 수 만년일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된 옛말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쓰는 순우리말에는 처음의 옛말이 변함없이 그대로 쓰이는 말도 있을 것이며 부분적으로 변하여 그 흔적만 남아있는 말도 있을 것이다. 순우리말이 처음의 옛말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세종이 훈민정음을 정리할 때의 옛말이 오늘날의 말로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말 변화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우리말의 처음의 옛말은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쓰고 있는 순우리말과 세종 때부터 내려온 옛말을 참고로 하여 우리말의 홀소리와 닿소리의 뜻을 살펴보고 그 뜻으로 닿소리와 홀소리가 합쳐진 낱소리의 뜻을 살펴보고 그 낱소리의 뜻으로 낱말의 뜻을 살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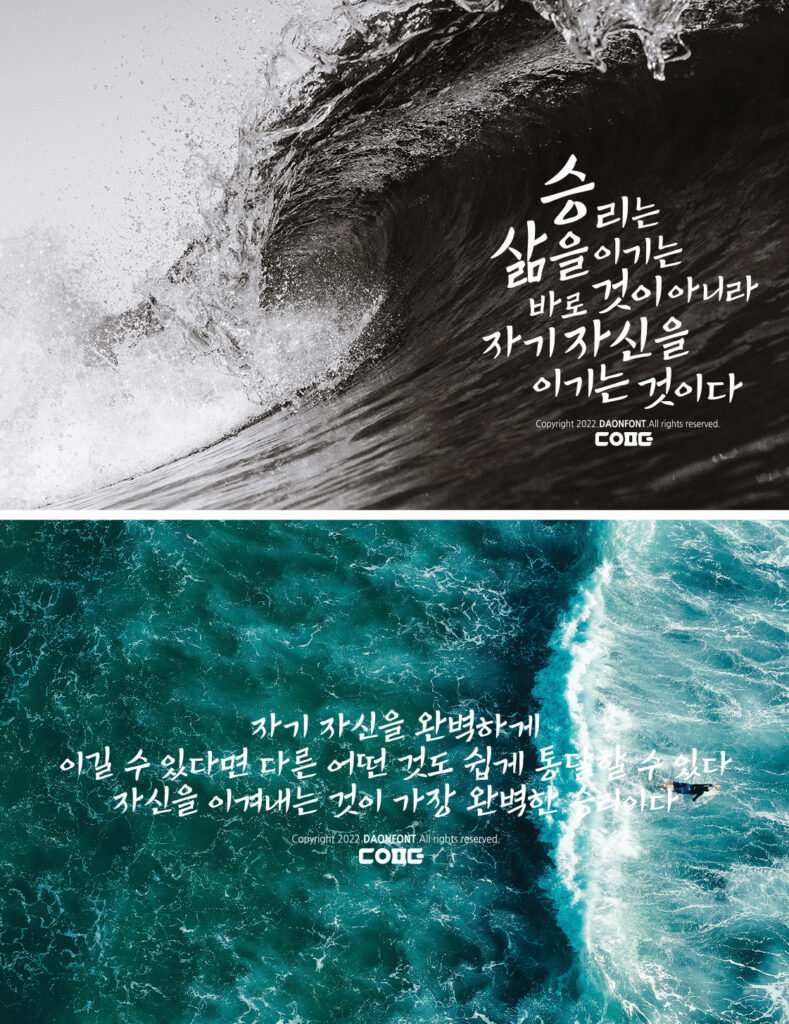
마: 사물의 성질이나 형태
1, 2 ,3 ,4에서 마르다는 사물에서 다나 다른 성질을 가진 사물이나 물질이 빠져나가거나 분리되어 그 사물만의 성질이나 본성물질이 점점 드러나는 상태를 나타낸다.
바르다
1-1.풀칠한 종이나 헝겊 따위를 다른 물건에 골고루 붙이다
1-2.물이나 풀, 약, 화장품 따위를 물체의 표면에 문질러 뭍히다
2-1.껍질을 벗기어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집어내다
2-2.뼈다귀에 붙은 살을 걷거나 가시 따위를 추려내다.
3-1.겉으로 보기에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다.
3-2:그늘이 지지 아니하고 햇볕이 잘 들다.
바르다=바+ㄹ+으+다
바:사물의 성질과 형태를 이루는 물질
1-1,1-2,3-1에서
바르다=바 +바 +바 +. . . . . . . . +바
으 으 으 으 바에 의하여 합쳐지면 다에 의하여 합쳐진 것과는 달리 쉽게 변하거나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낸다.
2-1, 2-2에서의 사물가는 바+바 또는 바+다 상태이다. 바+바일 때, 바르다=가-바-바-. . . . . . -바 바+다일 때, 바르다=가-다-다-. . . . . . -다 바를 가진 사물이 다른 사물이나 물질이 모여 함께 할 경우에는 성질이 다른 바를 분리시켜야 하고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바 본래의 성질이나 형태가 점점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3-2에서
바르다=바+다+다+. . , , . . +다
바르다는 사물의 성질이나 형태를 나타내는 바부분에 다물질(에너지물질)이 연속적으로 들어가 바부분이 뚜렷이 드러나는 상태를 나타낸다.
우리말에서 라는 같은 변화의 연속적인 반복을 나타낸다. 사물이 다른 사물이나 물질과 합쳐지거나 분리되는 상태가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면 라가 쓰여진다. 라가 쓰이는 낱말에서는 연속적인 반복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사물인지 물질인지 또는 합쳐질 때와 분리될 때를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사르다
1-1.불에 태워 없애다.
1-2.어떤 것을 남김없이 없애 버리다.
2.키 따위로 곡식을 까불러 쓸모없는 것을 떨어버리다.
사르다=사+ㄹ+으+다
사: 사물이 다른 사물이나 물질과 합쳐지거나 분리되어 자신의 성질이나 형태나 상태를 완전한 상태 또는 안정된 상태를 이루려는 성질이다.
1-1에서 사르다=가+다+다+. . . . . . +다=살 사르다는 사물이 다물질이 들어와 사물이 점점 최상의상태가 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1-1, 2에서 사르다=가-다-다- . . . . . . -다=살 사르다는 사물이 자신의 성질이나 형태가 다른 사물이나 물질을 내보내어 자신의 성질이나 형태가 점점 드러나게 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자르다
1-1.동강을 내거나 끊어 내다.
2.잘록할 정도로 단단히 죄어 매다.
자르다=자+ㄹ+으+다
자: 사물속의 입자들이 서로 붙어 크기가 작아지고 움직임이 적어진 상태를 나타낸다.
1-1은 하나의 사물이 나누어져 작아지는 상태를 나타낸다.
2는 사물을 죄어 매어 움직임이 적어진 상태를 나타낸다.
ㅡ브다, ㅡ쁘다, ㅡ프다
우리말에는 “ㅡㅂ다”를 쓰는 낱말이 많다, ㅡ스럽다, ㅡ 답다 따위로 쓰이며 주로 비유적인 낱말을 이루는데 쓰인다. 비유적인 말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실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느낌을 나타낸다. 우리말에서 형용사로 쓰이는 “ㅡㅂ다”는 모두 느낌을 나타낸다. 그리고 “-쁘다” “ㅡ프다”는 “ㅡ브다” 의 강한 상태의 느낌을 나타낸다.
덥다
1.기온이 높거나 기타의 이유로 느끼는 기운이 뜨겁다.
2.사물에 온도가 높다
덥다 = 더 +ㅂ + 다
더:”다“에 다른 “다“가 더 있는 상태
ㅂ다: 느낌
사물은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적정한 “다“가 있다. “다“는 열 물질을 나타내므로 덥다는 사물이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열 물질 보다 열 물질이 더 많은 상태를 나타낸다.
춥다
1.기온이 낮거나 기타의 이유로 몸에 느끼는 기운이 차다
춥다 = 추 +ㅂ +다
추: 사물에 바 물질이 꽉 차거나 압축되어 다 물질이 빠져나가 없는 상태,
ㅂ다: 느낌
춥다는 사물에 바 물질이 꽉 차거나 압축되어 다 의 근원 물질인 열이나 에너지가 없는 상태의 느낌을 나타낸다.
따갑다
1.살갗이 따끔거릴 만큼 열이 썩 높다.
2.눈길이나 충고 따위가 매섭고 날카롭다.
3.살을 찌르는 듯이 아픈 느낌이 있다.
따갑다 = 따 +가 + ㅂ다
따: 하나의 사물에서 일부를 떼어 낼 수 있는 강한 힘 또는 에너지를 나타낸다.
가: 하나의 사물
ㅂ다: 느낌
따갑다는 사물에 힘이나 자극을 받아 사물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나타낸다.
가렵다
1.피부에 긁고 싶은 느낌이 있다.
가렵다 = 가 + 리 + 어 + ㅂ 다.
가렵다는 사물의 일부분이 가려지는 느낌을 나타낸다.
사람이 가려울 때 긁어주면 다 가려지고 그러면 시원해진다.
쉽다
1.하기가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다.
2.예사롭거나 흔하다.
3.가능성이 많다.
쉽다 = 수 + ㅣ + ㅂ 다
수: 사물이 다른 사물이나 물질과 합쳐지거나 분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 상태.
이: 완료된 상태나 사물
ㅂ다: 느낌
쉽다는 어떤 일을 하는데 따로 힘을 더 들이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상태를 나타낸다.
어렵다
1.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다.
2.겪게 되는 곤란이나 시련이 많다.
3.말이나 글이 이해하기가 까다롭다.
4.가난하여 살아가기가 고생스럽다.
5.성미가 맞추기 힘들만큼 까다롭다.
6.가능성이 거의 없다.
어렵다 = 어 + 려 + ㅂ다
= 어리어 + ㅂ다
어: 사물이 다른 사물과 함께 하여 자신의 성질이나 힘을 제대로 나타 낼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피동의 상태)
리어: 반복, 계속
ㅂ다: 느낌
어렵다는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사물에 의하여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드러낼 수 없게 되거나 힘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가볍다 (옛<가비얍다)
가비얍다=가+비(바+이)+야+브다
가: 하나의 사물 비(바+이): 사물에서 다를 제외한 본성 물질부분인 바만을 나타낸다.야: 확산된 상태
브다: 느낌 바는 사물의 본성물질부분으로 사물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바물질 부분이며 다물질의 에너지물질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물에서 바물질이 확산되면 밀도가 낮아져 중력의 적게 받게 된다.
무겁다(옛<므겁다)
므겁다=므+거+브다
므: 사물의 본성물질이 남는 상태가 되어 성질이 강해진 상태 거: 사물 브다: 느낌 사물의 본성물질이 가득한 상태보다 더 많아지면 브상태가 되고 브상태의 형태와 성질을 므라고 하였다. 사물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바부분이며 브상태의 성질인 므는 마보다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상태를 나타낸다.
<계속>
- 뜻으로 본 우리말 11 - 2022-11-05
- 뜻으로 본 우리말 10 - 2022-09-23
- 뜻으로 본 우리말 9 - 2022-09-04